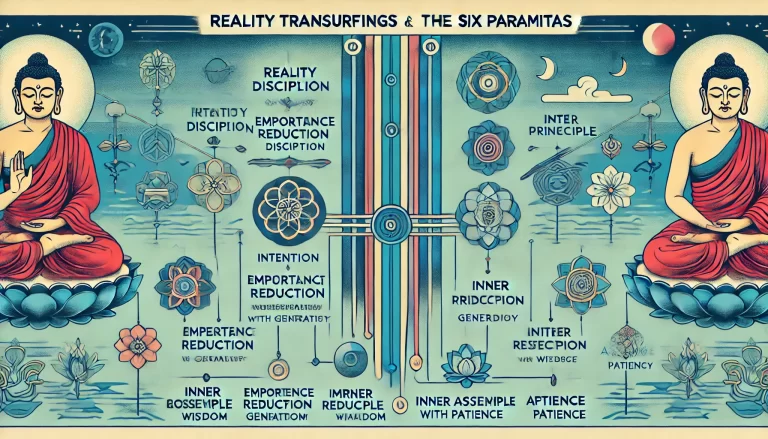화엄경 강의 1강 – 십지품 강의(보살의 길을 밝히다)
제공된 텍스트는 화엄경의 십지품을 중심으로 대승 불교의 영적 성숙 단계를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보살의 길을 강조하며, **십지(十地)**가 영적 지능 개발의 열 가지 단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강사는 기존 대승 불교의 수행 체계와 화엄경 본래의 가르침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의 개념들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와 그 원의미를 비교 분석합니다. 궁극적으로 참나를 깨닫고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불성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 보살의 목표임을 역설하며, 이는 전지전능한 신이 되는 것과는 다른 대승 불교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브리핑
본 브리핑 문서는 윤홍식의 화엄경 강의 4강 내용을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수행 단계, 특히 대승기신론과 화엄경에서 설명하는 참나(진여, 법신) 깨달음의 과정과 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핵심은 참나를 통한 ‘정혜쌍수(定慧雙修)’와 ‘반야방편쌍운(般若方便雙運)’의 중요성, 그리고 육바라밀 실천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1.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수행 52단계 (대승기신론 관점)
대승불교에서는 성불에 이르는 과정을 총 52단계로 나눈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다:
- 십신(十信) 단계: 참나를 명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 참나를 분명히 보았으나 아직 안착되지 않아 ‘믿고 가는’ 상태이다.
- 십주(十住) 단계: 참나를 보고 안주하는 단계. 참나가 늘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경지이다. 특히 일주 보살에 이르면 참나가 떠나지 않아 극락정토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참나가 떠나지 않아요 이제 일주 보살이 되면요 우리 안에 텅빈 각성인 참나가 늘 흐릅니다 즉 우리는 지금 극락을 이미 차치하고 살아.” 이때부터는 뒤로 후퇴하지 않는 ‘불퇴(不退)’의 경지가 시작된다.
- 십행(十行) 단계: 행위를 닦는 단계.
- 십회향(十廻向) 단계: 공덕을 회향하는 단계.
- 십지(十地) 단계: 깨달음의 깊이가 심화되는 단계. ‘등각(等覺)’이라 불리며 부처님과 거의 동등한 깨달음에 이른다.
- 십일지(十一地) & 십이지(十二地): 십일지는 십지에서 십이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십이지에 이르면 ‘묘각(妙覺)’의 경지로 전지전능하며 온 우주에 존재하며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하는 존재가 된다. 이는 비로자나불(밀교의 대일여래)과 같은 ‘하나님’의 경지에 해당한다.
성불에 이르는 시간: 일반적인 불교 가르침에 따르면, 한 중생이 성불하기까지는 ‘삼 무량겁(三無量劫)’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일주 보살’이 되기까지 약 1만 겁, ‘일지 보살’이 되기까지 무량겁, ‘칠지 보살’이 되기까지 또 무량겁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2. 최상승선(最上乘禪)의 원리
강의자는 ‘최상승선’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며 그 본질을 강조한다.
- 진정한 최상승선의 의미: “에고가 선정과 지혜를 열심히 닦아야 참나가 드러난다고 하는 공부는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최상승선 입자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곧장 참나를 잡으시면 그냥 끝난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 원리가 최상승선 원리입니다.” 즉, 참나는 본래 ‘정애쌍수(定慧雙修)’이므로, 에고의 노력 없이 곧바로 참나를 직시하여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 방편은 중요하지 않다: 화두든 염불이든, 어떤 방편을 사용하든 중요하지 않다. “단박에 시간이 안 걸려야 돼요… 에고를 뚫고 그 자리를 바로 만나는게 최상승선입니다.” 즉, ‘해광반조(廻光返照)’와 같이 에고의 생각 작용을 넘어 곧바로 참나를 만나는 것이 핵심이다.
- ‘모른다’ 법문: 최상승선의 핵심 방편으로 ‘모른다’ 법문을 제시한다. 대승기신론에서도 호흡, 몸, 지수화풍, 심지어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까지 “몰라” 해버리는 방법을 통해 에고의 분별심을 내려놓고 참나를 직시할 것을 강조한다. “모든 법이 본래 상이 없어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먼저 마음을 따라 밖으로 경계를 분별하지 말 것이며 뒤에 마음으로 분별하지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마저 다 몰라 해버리면 해야 된다.”
3. 일주 보살의 깨달음과 ‘정혜쌍수’
- 일주 보살의 정의: 십신(十信) 단계를 넘어 참나를 명확히 안착시킨 경지이다. “참나가 딱 잡았기 때문에 직심 늘 거듭 마음이 발심이 됐고요 거듭 마음이라는 건 친여이 진여는 걸 이제 정확히 봤어요.”
- 일주 보살의 발심(發心):직심(直心): 진여를 정확히 본 마음.
- 심심(深心): 선한 행위를 쌓기를 즐기는 마음 (육바라밀 실천).
- 대비심(大悲心): 다른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
- ‘견성(見性)’은 공부의 시작점: 일주 보살의 경지는 ‘견성’이라 불리며, “법신을 조금 밖에 못 봤어요.” 따라서 이는 성불을 향한 공부의 시작점이다.
- 정혜쌍운(定慧雙運) 또는 직관쌍운(直觀雙運): 일주 보살은 “늘 텅 비어 있으면서 늘 알아차리는 존재가 돼요.” 이것이 바로 ‘정혜쌍수’의 경지이다. 참나 자체가 본래 고요하고(정) 알아차리고(혜) 있기 때문이다.
4. 일지 보살로 나아가는 길과 ‘반야방편쌍운’
- 일주 이후 육바라밀 실천의 중요성: 일주 보살은 참나를 알았지만 에고의 업장(무지장, 번뇌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통해 이를 정화해야 한다. “참나는 정의 늘 정의 상태지만 에고가 지금 더럽다 육바라밀이란 청정하다 거 알았다면 에고 업장 정화에 나서자 이겁니다.”
- 육바라밀의 원리 (참나의 속성 이해):보시(布施): 참나가 ‘무욕(無欲)’이기 때문에 욕심 없음에서 우러나와 남을 돕는 보시를 실천한다.
- 지계(持戒): 참나가 ‘청정(淸淨)’하기 때문에 유혹에 물들지 않고 계율을 지킨다.
- 인욕(忍辱): 참나가 ‘조화(調和)’를 중시하기 때문에 분노나 증오 대신 상황을 수용하고 조화롭게 대처하는 인욕을 실천한다.
- 정진(精進): 참나가 ‘성실(誠實)’하기 때문에 게으름 없이 부단히 노력한다.
- 선정(禪定): 참나가 ‘안정(安定)’되어 고요하기 때문에 에고도 참나를 따라 명상하고 선정에 든다.
- 지혜(智慧): 참나가 ‘광명(光明)’하고 어둡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는 지혜를 추구한다.
- 인과응보의 중요성: 뉴에이지 사상 등에서 인과를 부정하는 경향을 비판하며, 대승기신론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갚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라고 강조한다. 참나가 존재하는 한 우주의 인과법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즉, 현상적으로 텅 비어 있지만 인과 업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 일지 보살의 발심 (‘증발심’): 육바라밀을 꾸준히 닦아 나가는 과정의 끝에 일지 보살에 이르게 되며, 이때 ‘정심(淨心)’이라 불리는 청정한 마음을 얻는다. 일지 보살은 ‘법신 보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만법(萬法)을 갖추고 있는 참나’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 반야방편쌍운(般若方便雙運): 일주 보살의 ‘정혜쌍수(직관쌍운)’가 ‘깨어있음’에 중점을 둔다면, 일지 보살의 ‘반야방편쌍운’은 ‘깨어있음(반야)’과 함께 ‘육바라밀 실천(방편)’이 바깥으로 드러나 현실에서 구현되는 경지를 의미한다.
5. 화엄경과 대승기신론의 차이점
- 관점의 차이: 대승기신론이 십신부터 시작하여 성불의 52단계를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 화엄경은 바로 ‘십지(十地)’부터 설명이 시작된다.
- 일지 보살의 의미: 화엄경에서는 ‘일지’를 곧 ‘십주(十住)’로 보아, 일지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머무름’이라고 이해한다. 즉, 화엄경은 참나를 안착시키는 초기 단계를 자세히 다루기보다, 참나를 확실히 깨달은 이후의 보살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강의는 참나 깨달음이 단지 내면의 고요함이나 알아차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세상 속에서 ‘반야와 방편이 함께 운용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즉,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며, 진정한 성불은 무지와 아집으로 이루어진 에고의 업장을 정화하고 참나의 속성(무욕, 청정, 조화, 성실, 안정, 광명)을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완성뿐만 아니라 중생 구제라는 보살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홍익학당] 생명의 법칙 육바라밀](https://fantasticego.com/wp-content/uploads/2025/04/생명의-법칙-육바라밀-768x432.jpg)

![[양심인문학] AI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https://fantasticego.com/wp-content/uploads/2025/07/ai-시대에-대비하는-홍익학당-768x432.jpg)